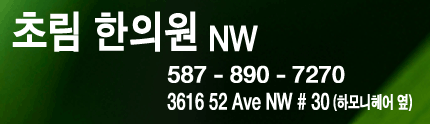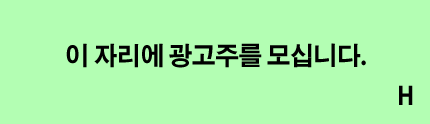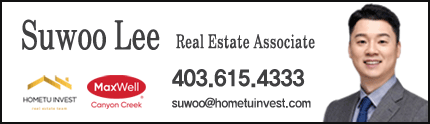==========

건축물과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세계의 대가들이 한결같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한국의 4 대 명물이 있다.
넷째가 영주(풍기) 부석사
셋째가 안동 병산서원
둘째가 서울 창덕궁 후원
그리고 첫번째,
죽기전에 반드시 가 봐야 할 한국의 명소로 종묘를 꼽는다.
이 말을 처음 전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 씨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이기도 하다.
건축과 문화유산에 대해 문외한이더라도 명소를 보는 느낌은 다 비슷한 것일까?
이미 이 네 곳을 모두 다녀온 나는 경이롭게도 네 명소 모두의 깊은 매력에 푹 빠졌었다.
그 중에서도 종묘는 하루가 멀다하고 방문했다.
숙소가 종로나 광화문일때는 거의 매일가서 산책했다.
언젠가부터 종묘 자유관람이 제한되고 가이드투어만 가능해지자 가이드투어에 참가해서라도 종묘산책은 빠지지 않았다.
특히 비오는 날
박석 위에 서서 바라보는 정전과 영녕전의 풍경은 표현하기 어려운 압권의 매력이었다.
전각사이를 잇는 길들은 신로와 보행로로 구분되어 있는 게 종묘의 특징이다.
고인들(조선 역대왕들과 왕비들)의 신주와 위패가 있는 사당이므로 신로를 따로 만들어 놓았다.
가운데 있는 신로는 왕들도 걸을 수 없었다.
종묘에서 산책하는 동안 외국인 여행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신로 위를 걷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박석으로 구성된 신로와 보행로가 전각 사이에 이어져 있는 종묘에는 차량이 출입할 수 없다.
박석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방차와 앰뷸런스 등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경내 차량통행이 금지된 이유다.
따라서 그 어느 누구도 차량으로 종묘에 들어오지 못한다.
문화재청장도 문체부장관도 대통령도 밖에서 내려 걸어서 들어와야 한다.
일제강점기 총독을 비롯한 식민지 관료들도 종묘에는 차를 타고 들어오지 않았다.
하긴 그들이 종묘에 들어올 일은 없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왕들도 종묘에 들어올때는 가마에서 내려 걸어서 들어왔다.
1 년에 한국에 두 번 씩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종묘산책이었다.
조선왕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역량을 총동원해 궁궐보다 더 섬세하게 지은 걸작에 매료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종묘는 나에게 특별한 감흥을 주는 특별한 장소였는데,
작년 가을,
이 세계문화유산이 능멸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어처구니가 없었다.
거의 1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어처구니가 없다.
아마도 올해 9 월 한국방문때는,
아니 아마도 당분간은 종묘에 가게 될 것 같지가 않다.